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문제는 통일된 개념 결여
도민대학 ‘『순수이성비판』읽기 Ⅱ’ 제 4강 9일 저녁에 열려
부분 기호[§]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월 9일 저녁 7시 서귀포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제주에서 순수이성비판 읽기2> 네 번째 강의를 들었다. 이날 주제는 ‘데카르트에서 칸트까지 순수 개념 논란’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판단의 범주에 대해서 배웠고 논리학 원론으로부터 칸트의 논리학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했다. 강의의 내용을 옮기는 것보다 ‘작가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김상봉 교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4월 2일에 들었던 내용과 결합해서 내가 이해한 질문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초판(1781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가 두 번째 판본(1787년)에 끼어 들어간 기호가 하나 있다. 그것은 §(파라그래프)이다. 이 기호는 법조문을 설명할 때 쓰는 것으로 무엇인가 확정된 철학적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두 번째 판본에서 선험론적 감성론을 설명할 때 §1~9를 사용한 뒤 한 동안 쓰지 않다가 선험론적 분석론 중에서 <순수 지성개념 또는 범주에 관하여>라는 소제목 앞에 갑작스레 §10을 삽입한다.
§을 쓰는 것은 당시 독일 강단철학자(독일 대학 철학 교수들)의 일반적인 글쓰기 방법이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출간하기 11년 전인 1770년 교수가 된다. (당시 46세) 이 책을 쓰기 전에 출간한 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틴어로 작성된 그의 교수 취임 논문에는 §가 있었다. 김상봉 교수는 칸트가 초판을 내고 나서 동료 교수들이 ‘당신은 왜 §을 쓰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 또는 힐난을 들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칸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칸트의 § 기호 사용에 관한 딜레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기호인가? 그것은 칸트 이전과 이후의 세계관을 가르는 일종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칸트가 언급하는 용어 중에서 독단론, 독단주의, 독단주의 철학, 독단주의자들은 매도나 비난의 표현이 아니다. 도그마는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뜻이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도그마적인 철학이라는 것은 정립된 철학을 뜻한다. <논어>에 나오는 ‘학지불강(學之不講)’이 도그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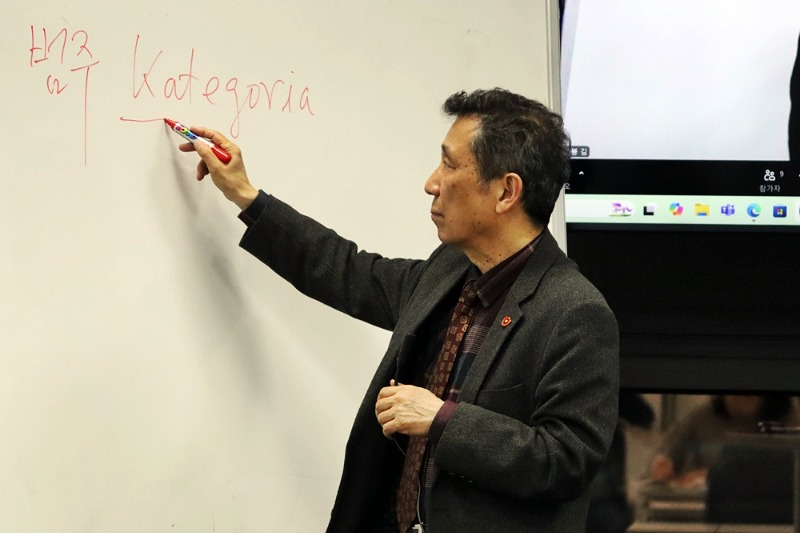
“공자가 말했다. ‘덕이 제대로 닦이지 않는 것,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지 않은 학문, 실천되지 않은 정의, 고쳐지지 않은 잘못은 나의 근심거리다’.”(논어 술이편)
칸트는 왜 § 기호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 자신의 글쓰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칸트의 글쓰기는 질문하는 글쓰기이다. 하지만 확정된 철학적 담론의 기호인 §는 질문을 끝맺는다. 당시의 강단철학자들 역시 질문하며 채을 쓰지 않았다. 『순수이성 비판』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책이 아닌 것이고, 칸트는 독자들을 질문으로 초대한다.
“인간의 이성은 어떤 종류의 인식에서 특수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인간 이성은 이성의 자연본성 자체로부터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도 없고 그의 전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순수이성 비판』 A판 머리말)
칸트는 ‘인간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다. 대답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그 질문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순수이성 비판』은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맹자는 인간의 병통은 가르치려 드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가르치려 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수밖에 없다. 김상봉 교수는 “우리는 철학은 배울 수 없고 단지 ‘철학함’만 배울 수 있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에게는 어쩌면 philosophy(철학)보다 philosophing(철학함)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문에도 차원이 있다. 적당한 질문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질문이라고 할 수 없다. 불편한 질문, 위험한 질문, 존재를 뒤흔드는 딜레마적인 질문이야말로 ‘자유와 진리’라는 서양의 정신이다. 진리는 자유의 근거이며, 자유 또한 진리의 근거다. 진리와 자유가 서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서양 정신의 핵심이다. 김상봉 교수는 서양 사람들은 ‘왜’를 묻는 데 장애가 없었다고 말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주눅 들지 않고 감히 질문을 하는 것은 서양의 전통이다. 김상봉 교수는 대학에 있으면서 보게 되는 씁쓸한 모습은 신입생들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질문의 힘이 퇴화된 채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칸트가 ‘판단’을 캐스팅한 까닭
칸트는 인간의 생각의 형식을 말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개념론, 판단론, 추론, 오류론이 필요하다. 개념론은 말을 할 때 개념이 정확해야 한다는 논증을 다룬다. 개념이 규정되고 나면 개념과 개념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판단론이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개념을 정의했다고 한다면 “고양이는 동물이다”, “고양이는 포유류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때 고양이와 동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야만 고양이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판단론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와 술어를 일치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참된 진술이다.
칸트는 생각에 대한 철학을 ‘판단’에서 시작했다. 판단이야말로 생각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논리학자들은 판단과 명제를 구분한다. 김상봉 교수는 Chat GPT에게 명제와 판단의 차이를 묻고 받은 답변들을 소개했다.
명제 : 참 또는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언어적 표현
판단 : 명제에 대한 인식적 결정.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미 있는 진술은 ‘판단’이 아니라 ‘명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판단은 개연적 견해로 간주된다. 근대 철학자 라이프니츠 역시 『신인간지성론』에서 명제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진술이라면 판단은 참과 거짓을 원칙적으로는 분별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연적 진술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많은 철학자와 논리학자들이 판단보다는 ‘명제’의 손을 들어준 반면, 칸트는 ‘판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칸트는 왜 ‘판단’을 캐스팅한 걸까? 칸트는 말한다.
“표상들을 하나의 의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판단이다”
칸트에게 판단은 정적인 표상이 아니고 표상들을 결합하고 통일하는 활동이다. 칸트에게 철학보다 ‘철학함’이 중요했듯이, 명제가 아니라 개념과 개념을 결합하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결이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칸트가 판단 형식을 분류할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언어적 진술인 명제로 나타난 판단들이 아니라 ‘언어적 진술의 근저에 놓여 있는 종합과 통일의 기능과 활동으로서의 판단 작용’이다. 칸트는 이런 기능이야말로 사유의 본질이며, 이런 사유 작용으로부터 형식논리적 판단이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여러 표상들이 하나의 표상으로 통일된 것이 개념이다. 직관 속에서 원자적으로 찍히는 직관 표상들을 종합해서 ‘이것은 개구나’, ‘이것은 고양이구나’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합을 해야 한다. 개념이 있기 위해서는 판단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칸트가 나의 몸과 심장에 불어넣은 역동성에 감전된 것 같았다. 나는 철학 공부를 하면서 ‘철학함’과 ‘철학’을 구분하지 못했고, ‘철학’과 ‘고전문헌학’을 구분하지 못했다. 정적인 의미의 철학을 구구단처럼 암기했던 지난날이 낯 뜨겁게 펼쳐졌다. 개념은 사소한 그 무엇 하나도 그냥 내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없었다. 표상을 통일하는 판단의 작업을 거쳐서 내가 그 개념을 인식한다면 그것이 그릇된 개념으로 와전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놓아야 할 것인가?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어떤 판단 작업을 통해서 왜곡되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공격의 무기가 된 까닭은 자유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제나 거기 서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한다. 후보자는 판사 시절 소액이더라도 횡령은 사소한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400원’, ‘횡령’, ‘해고’라는 개념들이 종합되는 과정에서 ‘판단’이 해 놓은 작업의 결과물이 재조명되고 구설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당장 이 판단을 ‘2400억원’, ‘횡령’, ‘무죄’라는 현실들이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김상봉 교수는 ‘개념의 합의’에 대해서 말했다. ‘횡령’이라는 개념이 서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지 못한다고. ‘자유’라는 개념이 합의되지 못한다면 서로 다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대화 자체가 되지 못한다고.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언어적 진술의 근저에 놓여 있는 종합과 통일의 기능과 활동’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오승주
제주 성산포에서 태어나 전형적인 어촌 소년처럼 10년간 사춘기, 놈팽이로 살다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특히 동양철학을 좋아해 서당에 다녔고 공자를 지적으로 스토킹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왔다. 제주4.3과 제주신화에 관심이 많은 소설가 지망생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주 다른기사보기



